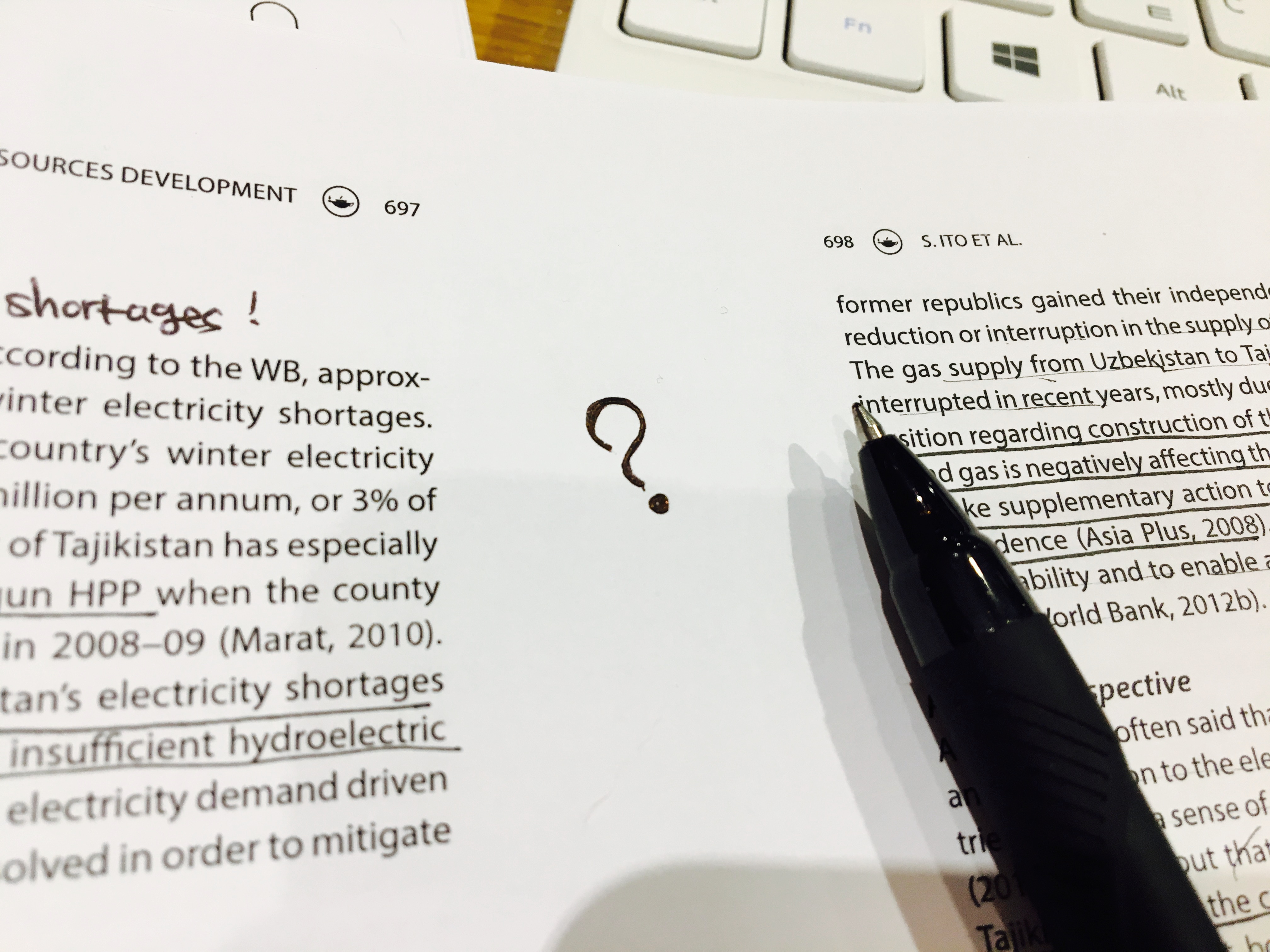
내가 최근 몇 년 간 힘들었던 시절을 꼽으라면,
그 중 하나는 이 블로그를 시작했던 대학원생 시절이었다.
그 시절, 나는 생각보다 벅찬 학업 생활에 지쳐있었고, 공부 외에는 경제적인 문제로도 항상 고민이 많았다. 간신히 조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겼었다.
나름 익명으로 운영하는 나의 블로그에서조차, 이런 문제들을 구구절절 쓴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이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벌써 만 2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몇 다리만 건너면 서로 알게 되는 이 좁은 세상과 가뜩이나 또 좁은 나의 전공 분야 바닥을 알기에, 대학원에서의 이슈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픈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가장 힘들었던 일 몇 가지를 적어본다면, 아무래도 내가 따라가기 벅찬 능력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보며 느꼈던 좌절감,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금수저..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대상으로 금이네, 은이네, 흙이네 하고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계층을 나누는 단어들이 사회의 계층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느꼈던 나의 좌절감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들을 때때로 내 머릿속에 불러오곤 했다.
대학원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게중에는 본인의 학습능력과 공부하는 일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제외하고는 다른 큰 어려움 없이 석사도 하고 박사과정까지 밟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오력해서 재정적으로는 크게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문제는 나는 학업을 지속할 상황적인 여건도 받쳐주지 않았고, 그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만한 뛰어난 역량도 딱히 없는, 정말 그냥저냥 평범한 석사 후보생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막판에 지도교수를 교체하며, 논문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면서 과연 내가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남는 것이 있을지, 졸업이나 할 수 있을지 막막했었다.
이미 2학기를 지날 때부터, 석사를 하고 나면 더 많은 길이 열릴 것 같고 진로에 대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1학기의 꿈같은 기대와 희망들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내가 있는 분야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나면 갈 수 있는 자리 중에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괜찮거나 좋은 곳들은 경쟁이 치열했으며, 대부분은 ‘고급 계약직’이거나, 일하는 시간은 누구보다 많은데 야근 수당 따위는 통상 임금으로 치는 박봉인 자리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박봉인 자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증말 노오오오오오력 이라는 것을 하면 박사과정을, 국내든 해외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서 여~~~얼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씸히(!) 시간강사 일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른들의 조언(이라고 쓰고...)은, 석사과정에서도 허덕이는 나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았다고, 이제서야 고백 아닌 고백을 쏟아내 본다.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학원 시절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나자 방황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전공 분야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인턴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을 가려고 공채 준비를 했는데 마냥 공부만 할 수는 없어서 오직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일단 되는 대로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갔다.
그리고 세 번의 공채 실패,
세 번이나 도전했던 공채에서 나는 보기 좋게 고배를 마셨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얻은 것은 첫 번째 관문인 필기시험(보통 1000여 명이 지원하고 100명 정도가 통과)에서는 세 번 모두 통과하면서 나름 ‘내가 공부 머리가 없지는 않구나’라는 위안 정도.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뚫고 올라간 면접에서, 전략의 실패 또는 따라주지 않는 면접관과의 케미 등으로 실패를 맛보고야 말았다. 어리석은 내 탓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를 갈며 세 번이나 도전했지만 밀려난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곳과의 인연은 딱 인턴 때까지였다는 생각이 최근에서야 들었다.
공채를 접고 난 후, 또다시 이어진 수많은 면접과 탈락의 결과들. 찬 바람을 맞으며 면접장으로 향할 때마다 ‘이번에는 제발..’, ‘너무 기대하지 말자...’와 같은 생각들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다. 그렇게 한동안 잿빛 터널같은 시간을 보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그리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여의치 않을 때 슬럼프는 스멀스멀 찾아오는 것 같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방황과 연이은 실패로 나의 자존감은 참 많이 낮아져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나의 대학원 시절과 이후의 취업준비 과정을 돌아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기와 깡으로 버텨준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그럼에도, 가끔은 관성처럼, 일터에서도 ‘난 이것밖에 못하나?’,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와 같은 생각들로 스스로를 쿡쿡 찌르는 나를 발견한다. 거참,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옥죄고 여전히 부족한 점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은 어디 가질 않는다. 아마도 일종의 '관성'이 되어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된 지금도, 자꾸 나의 폐부를 건드리는 모양이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한마디씩 툭 던져주고 싶다. "마, 이제 숨 좀 쉬어라, 쫌!"
'세이지의 일상 (Daily life of Sage) > Day by day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의 취향] 설민석씨의 강의가 와닿지 않는 이유 (0) | 2020.12.27 |
|---|---|
| 호의를 호의로 받을 수 없는 이유 (0) | 2020.10.15 |
| 나의 내면아이에게 (1) | 2020.09.26 |
| 내가 좋아하는 것들 (0) | 2020.09.15 |
| 소소하게 행복하기 (0) | 2020.09.11 |